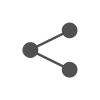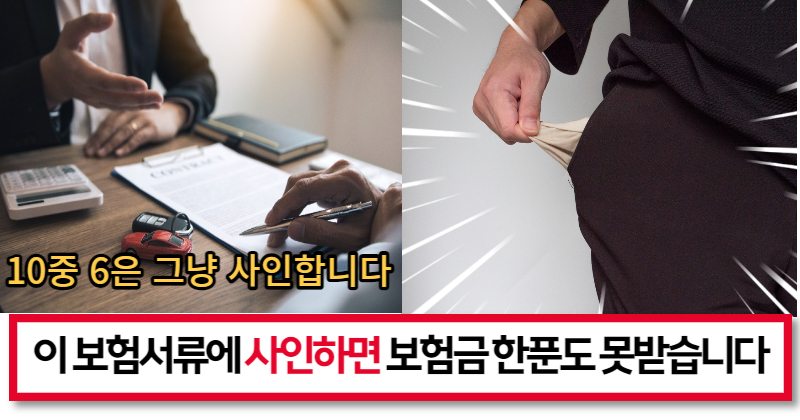“손이 떨려서 밥을 못 먹겄어.”
[sc name=”half”]우리 오남매를 위해 밥을 지었던 손이 이젠 엄마 자신의 수저도 들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없다고 한다.[sc name=”half2″]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 뚜껑을 냄비 뚜껑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던 기운은 어디로 갔을까.
| ✅ 함께 보면 더 좋은글 |
얼마 전, 요양원 면회 때 좀 더 심해진 손 떨림을 보고 걱정스러웠다.
좋아지길 바랐는데 밥 먹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울적하다. 집에 와서 함께 지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누가 내 꼴을 보겠냐. 똥 싸지 오줌 싸지, 하루도 힘들어. 여기 선생님들이 잘혀” 하신다.
아니라고, 그래도 오면 좋겠다고 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걸 엄마는 잘 알고 있다.
[sc name=”half”]오히려 잠시 비웠다가 지금 있는 자리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게 더 두렵다.[sc name=”half2″]
몇 달 전, 엄마와 일주일을 집에서 지냈다. 그리운 자식들과 해후를 하고 나더니 요양원 친구와 선생님들을 찾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보다 요양원 선생님이 덜 미안하고 덜 불편하다고 했다.
[sc name=”half”]
똥오줌을 자식 손에 맡겨보니 서툴기도 하고 새벽녘에 자는 딸을 부르니 사위까지 나타나 곤란스럽다. “어머니,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괜찮아요.”[sc name=”half2”]
젖은 요를 갈아주며 위로하는 사위에게 민망해서 몸둘바를 모른다. 엄마는 모두가 적응하기 위해 보내야 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
‘좀 편해도 좋으련만.’
볼 일도 많을 텐데… 몸도 약한데… 당신 옆을 지키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자식의 진심은 부모의 진심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가벼운지 깨닫는다.
도리와 사랑의 차이 만큼이다 기운다.
후회하던 엄마, 나도 후회하겠지
40여 년 전, 대장암 수술을 한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 항문이 배꼽 옆에 있어 기저귀를 대고 살았다.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다.
엄마는 수시로 나오는 빨랫감을 곧바로 손빨래 해서 앞마당에 널었다. 빨랫줄에 대여섯 개의 기저귀가 반으로 접혀 휘날리면 마당이 새하얀 색으로 가득했다.
햇볕을 받아 광택이 나는 기저귀를 바라보면 마음도 깨끗하게 말려지는 기분이었다. 엄마는 밤에도 외할머니 곁을 지키며 고단한 하루를 뉘였다.
“어머니, 나 좀 깨우지 마. 내가 자야 일을 혀.”
임종이 다가오고 있어서였는지 할머니는 자주 엄마를 깨웠다.
눈만 뜨면 해야 할 일로 가득한데 엄마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엄마의 진심은 내가 어릴 때부터 보아 온 모습 그대로였다.
애타게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곁에 두고 돌보는 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 보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 엄마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
|
📌 함께보면 좋은 글 |
뜬금없는 말에 이유를 물었더니, 냄새나는 할머니 옆에서 불평 한 마디 안 했다는 거였다. 사실 나는 냄새를 참은 게 아니라 냄새를 못 느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방귀만 뀌어도 온 방 안이 진동하는데 기저귀를 갈을 때마다 냄새가 없을 리 없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내 코는 정상이 아니었다.
엄마는 종종 자는 딸을 깨울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다. 더 못한 것을 후회하는 엄마를 기억한다. 나는 더 후회하겠지.
내 아이들의 전화가 기다려질 때 나는 엄마에게 전화한다. 내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 언제 전화해도 “왜?” 이렇게 묻질 않는다.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 부모는 자식을 한 순간도 잊지 못한다. 부모가 되면서 그렇게 정해진다.
“엄마, 그냥 전화했어.”
“그럼 그냥 전화하지, 뭔 일이 꼭 있어야 허냐.”
엄마는 ‘그냥’이 더 좋은 모양이다. 그냥 생각나고, 그냥 보고 싶은 엄마이고 싶은 거다. 자식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고 있을 모습이 그려진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오래 살어서 미안헌디.”
미안한 건 난데 엄마는 매번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한다.
[출처 :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 함께 보면 더 좋은글 |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